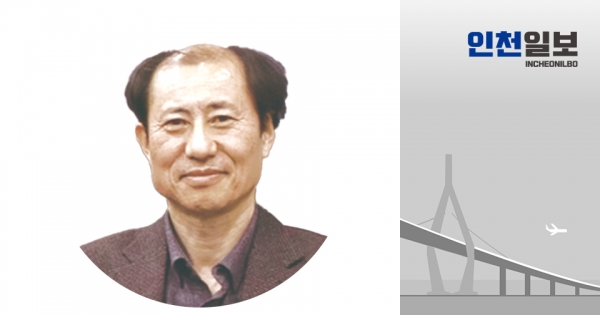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가수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노래한 바 있고, 어떤 가수는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라고 노래하였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니 자기 자신만이라도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 세계에 던져진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자를 존재케 하는 존재의 무게를 견디어 낸다는 것,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는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시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동네 어귀에 서 있는 오백 년 묵은 나무가 그 동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듯이, 도시도 그 역사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도시가 산다는 것은, 도시가 사는 법은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에 의해 흔적을 창조하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각국공원', '만국공원'은 열강들의 힘에 굴복해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비애가 서려 있으며, '자유공원'은 좌우 이념 대결로 동족이 상잔하는 전쟁의 상흔이 서려 있다. 또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예외상태 속에서, 장시간의 저임금에 시달렸던 나이 어린 여공의 비애가 서려 있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인천의 자부심, 자긍심은 무엇일 수 있을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을 치켜 내세울 만하다.
우현의 미학은 지나간 한 때의 미학이 아니다. 우현의 미학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나 볼 수 있는 박제화되고 방부 처리된 미이라의 미학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현행적인 미학이기 때문이다.
우현은 예술가에 대해 그들은 미학을 만들어낼지언정 미학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시를 쓰기 위하여 금강경을 읽거나 <도덕경>을 읽는 시인들이 있다면 가슴이 뜨끔해질 질타이다. 그렇다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이 타트(行)일 뿐인가? 석가에게도, 기독에게도, 공자에게도 타트(行)의 앞에 각기 독자적인 이념이 염두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단테나, 셰익스피어나, 레오나르도의 시대에 미학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각자의 예술관이 있었고, 각자의 미의 이념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현은 강조한다.
“그들은 단어를 의도 없이 나열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화필(畵筆)을 기교의 자랑으로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사회에서, 자연에서 미의 이념을 천득(闡得)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다.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었다. 예술가에게서 철학이라는 요소를 거세하면 실로 한 개의 공장(工匠)에 지나지 않는다.”('미(美)의 시대성과 신시대(新時代) 예술가의 임무')
또한 우현은 '현대 세계미술계의 귀추'에서 미래의 예술에 대하여 예언가적 발언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자못 심장하다. “예술은 모방이 아니요, 창조가 아니요, 실로 실로 몽타주이다. 나는 자신을 갖고 조선화가에게 이것을 명백히 제시한다.” 예술이 몽타주라니,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창조적 모방, 모방적 창조. 예술은 모방과 창조의 비규정성과 불확실성의 객관적 지대라는 것이다. 공통의 근방과 식별 불가능의 지대. 모방으로도 창조로도 환원되지 않는 환원 불가능의 지대, 차라리 리좀이다. 우현은 이 지점에서 시간의 지층을 뚫고 솟아나 21세기 들뢰즈와 조우한다. 우현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제압하고, AI가 예술을 몽타주 하는 작금의 사태를 미리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
/송성섭 풍물미학연구소 소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